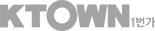- [내 마음의 韓詩 500 – Korean Poems of My Heart 500] 松竹師表3822024.05.18
- Virginia Countryside Scenes3292024.06.02
- [내 마음의 隨筆] 충혼시 (忠魂詩) - 1 of 23612024.06.03
- [내 마음의 隨筆] MASTER SLAVE HUSBAND WIFE를 읽고 - 1 of 23862024.06.11
- [내 마음의 隨筆] 충혼시 (忠魂詩) - 2 of 24252024.06.04
[내 마음의 隨筆] 충혼시 (忠魂詩) - 1 of 2
2024.06.03[내 마음의 隨筆]
충혼시 (忠魂詩)
지난 월요일 (5월 27일)은 미국의 Memorial Day 였고, 이제 오는 6월 6일은 한국의 현충일이다. 민족의 비극인 6/25 때문인지 매년 6월은 다른 달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영령들에 대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릴적 아버님께서는 매년 顯忠塔 (현충탑)에 경건히 묵념을 올리는 예를 빼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코흘리개인 나로서는 부끄럽게도 현충 (顯忠)의 그 깊은 의미를 솔직히 그 때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였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야 ‘충성스러움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떨침’이라는 의미의 현충 (顯忠)과 ‘충성스럽고 의로운 넋’의 의미인 충혼 (忠魂)이라는 두 단어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되어 다시금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곤 한다.
한시 (韓詩)를 취미로 조금씩 작시해 오고 있는 나는 문득 조국에 대한 충의 (忠義)의 마음을 표현해서 수백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오롯이 문중에 전해 내려오는 선조들의 한시를 통해 그분들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소개하고자 하는 세분의 선조는 貞烈公 최윤덕 (崔潤德: 1376 – 1446) 장상 (將相), 簡易 최립 (崔岦: 1539 – 1612), 그리고 玉圃 최산정 (崔山靜: 1535-1593) 이시다.
최윤덕은 조선조 4군을 개척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한 북벌정책을 총지휘한 조선초의 무신 (武臣), 최립은 임진왜란시 대명외교 (對明外交)를 도맡아 외교문서 작성자의 제일인자로 불리웠던 조선중기의 외교관이며 문신 (文臣), 그리고 최산정은 임진왜란 때 전쟁터를 누비던 조선조의 무관 (武官)이다.
최윤덕은 뛰어난 명궁 (名弓)이었으며 달리는 말위에서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아서 어려서부터 용맹이 자자했으며 평생을 거의 전장에서 일생을 보낸 세종이 가장 아끼는 신하 중의 하나였다. 수백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의 용맹과 청렴,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최윤덕 영정. 출처=通川崔氏 追遠錄
그의 별명은 ‘축성대감 (築城大監)’으로 전국을 돌며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각지의 지형에 맞는 산성이나 읍성의 구조나 위치를 세밀하게 연구하여 성 (城) 쌓기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감독하였다. 이는 평화로운 때에 견고한 성을 쌓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유비무환 (有備無患)의 뼈저린 교훈을 그는 오랜 전투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 실제로 튼튼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혜안은 이이의 10만 양병설에 140여 년 앞서서 일본의 침략을 예언하였다.
호연정기(浩然亭記)
내가 금계에 와서 정신이 소모되고 기력이 감축되어 아름다움을 찾아 뛰어나게 경치가 좋은 곳을 얻으니, 이는 곧 석각정(石角亭)이다.
전일 정신이 소모하고 기력이 감축된 것이 활연해 지고,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멀리 추부자(맹자)의 浩然之氣(공명정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 용기)를 잘 기르는 뜻으로, 정자에 이름을 붙이니, 이 두 자의 뜻은 오직 천지간에 꽉 찼을 뿐이다.
이로써 나의 정자를 이름하였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후대 사람들이여 비웃기를 멈출지어다. (通川崔氏 追遠錄)
至哉鄒孟氏 千古是吾師 (지재추맹씨 천고시오사)
二字斯亭揭 每觀動靜時 (이자사정게 매관동정시)
齊梁長夜世 誰識是賢師 (제량장야세 수식시현사)
惟此浩然氣 應無間斷時 (유차호연기 응무간단시)
지극하도다 추 나라 맹자는, 천고에 나의 스승이로세
두 글자를 이 정자에 걸어놓고, 매양 앉으나 서나 본다.
제 나라와 양 나라는 캄캄한 밤중이었으니, 뉘라서 이 어진 스승을 알아보랴
오직 이 호연지기는, 응당 한때라도 끊어지면 아니되리니.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그의 짧은 시 호우 (好雨)이다. 생사의 갈림길과 긴장의 연속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전쟁터를 전전하면서도 무인이지만 감수성 강한 그의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는 시라고 생각된다.
호우 (好雨)
好雨留人故故遲 當窓盡日聽江聲 (호우유인고고지 당창진일청강성)
좋은 비는 사람을 만류하여 떠날 길을 늦추니, 창가에 종일토록 강물소리 듣고 있네.
다음은 외교문서작성은 물론 문장과 역학, 한시 작시, 예술감평 등 다방면에 재주가 뛰어나 송도삼절 (松島三絶)이라고 불리웠던 희대의 천재 최립의 한시 두수를 소개한다. 그는 임진왜란 시기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꺼져가는 조선의 운명을 구해내기 위해 명나라에 네번의 사행길을 떠났는데, 그 때 교류한 중국의 명사들도 그의 치밀한 문장과 글씨 그리고 높은 학식에 감탄했다고 한다. (簡易 散文選)

최립 영정. 오른쪽 위에 ‘조선국판서공간이당최립지존영’이라고 적혀있다.
출처=通川崔氏 追遠錄
살아생전에 사람들로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정당하게 제대로 자신의 업적이 평가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행정관리와 외교관으로서 묵묵하게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며, 임금과 동료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문인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한시와 서예세계 및 조선의 고유한 산문체를 처음으로 확립하고, 서화 감평체계를 시도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생활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남긴 가히 ‘조선의 르네상스맨’으로 충분히 불릴만한 간이의 다양한 생애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나마 우리가 한글로 완역된 그의 문집인 簡易集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에 힘을 얻어 필자는 최립의 ‘創意的 時代精神’ (창의적 시대정신)에 매료되어 이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으로 해오고 있다.
*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 (독), Spirit of the Age or Spirit of the Time (영))
50개의 수석을 전시하여 그에게 한시를 지어보라 임금이 명령하니 그자리에서 그는 한시 50수를 쉬지않고 즉시 작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진주목사 6년 재임기간 동안 그가 유일하게 작시한 怪石(괴석)이란 제목의 시는 다음과 같다.
怪石(괴석)
窓間懸一虱 (창간현일슬)
目定車輪大 (목정차륜대)
自我得此石 (자아득차석)
不向華山坐 (하향화산좌)
창틈에 이 한 마리 달아 놓고
뚫어져라 보면 수레바퀴처럼 커 보이네.
이 돌을 얻고 나서는
화산(華山) 쪽으로 앉지도 않는다네.
최립의 걸작시로 매우 유명하여 이 시에 대한 후학들의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 한시雨後(우후)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필자의 해석을 소개한다. (







 funds available for investment
funds available for investment
 자연이 곧 법이 되어, 산행하는 이의 참된 자아가 고요히 펼쳐지는 뉴욕의 캐츠킬 산맥.
자연이 곧 법이 되어, 산행하는 이의 참된 자아가 고요히 펼쳐지는 뉴욕의 캐츠킬 산맥.
 437. 99회 LA 한인회 문화의 샘터 “퍼포먼스 라인댄스”
437. 99회 LA 한인회 문화의 샘터 “퍼포먼스 라인댄스”
 GOLF LESSONS 골프레슨 CLUB FACE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애너하임 플러튼
GOLF LESSONS 골프레슨 CLUB FACE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애너하임 플러튼
 후방추돌사고, 15,000달러 보상
후방추돌사고, 15,000달러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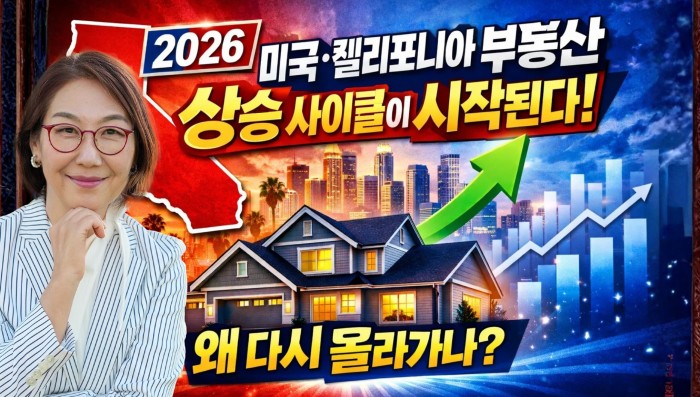 플러튼 1백만불대의 타운하우스 신축 vs 구축 어느 쪽을 선택할까?
플러튼 1백만불대의 타운하우스 신축 vs 구축 어느 쪽을 선택할까?
 1월 31일까지 저렴한 가격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1월 31일까지 저렴한 가격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세요.
 The heart that tends the flowers Lyrics by Don Kim
The heart that tends the flowers Lyrics by Don Kim
 Nembutal-Pentobarbital 구매, 시안화 칼륨 구매, Xanax 구매
Nembutal-Pentobarbital 구매, 시안화 칼륨 구매, Xanax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