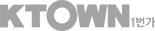- [내 마음의 隨筆] 반지는 약속이 아니고, 신의는 습관이다 - 2 of 2902026.01.12
- [An Essay from My Heart] A Ring Is Not a Promise; Fidelity Is a Habit732026.01.12
- [내 마음의 隨筆] 작품 앞에서 인간으로 남는 법772026.01.12
- [내 마음의 隨筆] 책 사이에 남겨진 마음1392026.01.21
- [An Essay from My Heart] How to Remain Human Before a Work of Art642026.01.12
[내 마음의 隨筆] 작품 앞에서 인간으로 남는 법
2026.01.12[내 마음의 隨筆]
작품 앞에서 인간으로 남는 법
— 예술에 대해 쓴다는 것의 의미
예술 작품 앞에 서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을 먼저 꺼낸다.
“아름답다”, “독특하다”, “강렬하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종종 작품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불편한 침묵을 피하려는 방어처럼 들린다.
말은 빠르지만, 보는 일은 늘 더디다.
미국의 실번 바넷(Sylvan Barnet, 1926-2016)은 『미술에 대해 글쓰기(A Short Guide to Writing About Art)』에서
예술 비평의 출발을 단호하게 규정한다.
‘평가하지 말고, 먼저 묘사하라.’
이는 글쓰기 기술에 대한 조언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태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바넷에게 미술에 대해 쓴다는 것은
감정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훈련이다.
이 점에서 바넷의 미술 글쓰기는
지극히 근대적이며 동시에 엄격하다.
작품에 대한 모든 해석은
형태, 구성, 재료, 공간이라는
구체적 근거 위에 놓여야 한다.
그는 근거 없는 찬사와 모호한 인상을
비평이 아니라 회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서양 미술 비평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최립(崔岦, 1539-1612)또한
글쓰기의 출발을 감정이 아니라 ‘관(觀)’에, 더 나아가 ‘정관(靜觀)’에 두었다. ‘정관(靜觀: 조용히 바라봄)’은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는 일,’ ‘말보다 먼저 침묵으로 사유하는 태도’를 말한다.
최립에게 ‘관(觀)’이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물 앞에서
자신의 말을 늦추는 윤리적 태도이며,
해석을 유예하는 지적 절제다.
그의 산문과 시에는
서둘러 결론에 도달한 흔적이 거의 없다.
대신 충분히 머물다 떠난 사람의
‘고요한 자국’이 남아 있다.
바넷이 요구한 ‘관찰(觀察)’과
최립이 실천한 ‘관조(觀照)’는
서로 다른 전통에 속해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한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다.
AI는 이미 이미지와 예술 작품을
인간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한다.
형식, 양식, 사조, 유사 사례를
몇 초 안에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작품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말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글쓰기가 여전히 의미를 갖는 지점은
바로 이 ‘침묵의 능력’에 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힘.’
바넷의 훈련이 ‘언어의 정확성’을 길러준다면,
최립의 태도는 ‘언어 이전의 절제’를 가르친다.
미술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작품을 설명하는 일이기 이전에
자신의 성급함을 점검하는 일이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의미를 붙이고,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리는가.
작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앞에 선 인간의 태도는
늘 시험대에 오른다.
결국 예술에 대해 쓴다는 일은
‘작품을 대상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무엇을 보았는가보다
결국은 ‘어떻게 보았는가’가 남는다.
실번 바넷은
‘정확히 말하는 인간’을 길러내고자 했고,
최립은
‘말을 삼킬 줄 아는 인간’을 남기고자 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얼핏 꽤 멀어 보이지만,
그들이 가리킨 방향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예술 앞에서
‘말을 늦출 수 있는 인간,’
‘침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간.’
아마도 그것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글을 쓰는 이유’일 것이다. ***
2026. 1. 12.
崇善齋에서
{솔티}
English Translation: https://www.ktown1st.com/blog/VALover/348210








 GOLF LESSONS 골프레슨 CLUB FACE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애너하임 플러튼
GOLF LESSONS 골프레슨 CLUB FACE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애너하임 플러튼
 인생의 석양을 맞은 미국 할머니 이야기 (Jan 31, 2026)
인생의 석양을 맞은 미국 할머니 이야기 (Jan 31, 2026)
 [An Essay from My Heart] The Joy of American Literature: M. Twain, Y. Kang, and John Steinbeck
[An Essay from My Heart] The Joy of American Literature: M. Twain, Y. Kang, and John Steinb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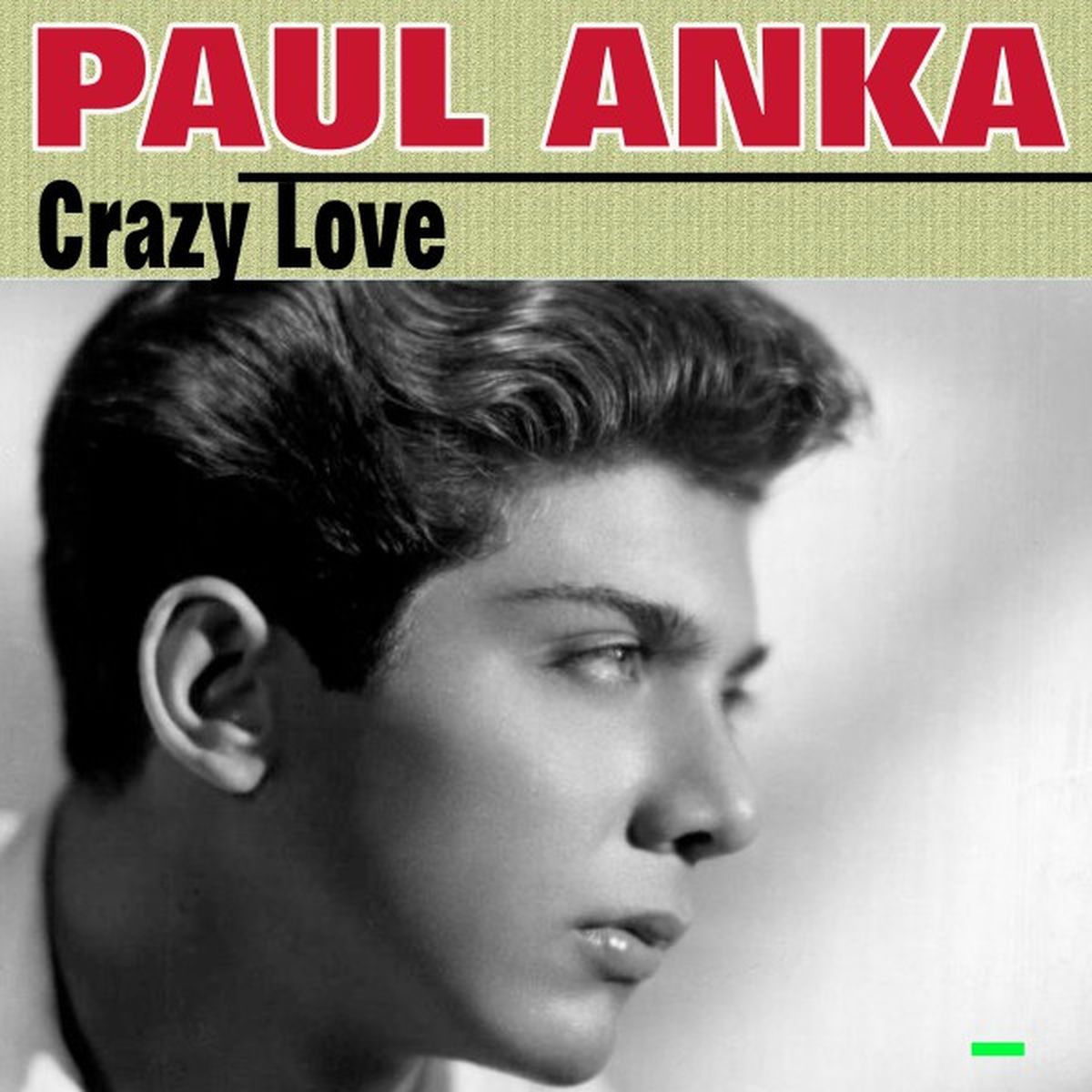 Paul Anka - Crazy Love (1958) with Lyrics
Paul Anka - Crazy Love (1958) with Lyrics
 1월10일▶◀운명을 달리 하신~
1월10일▶◀운명을 달리 하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플러튼 1백만불대의 타운하우스 신축 vs 구축 어느 쪽을 선택할까?
플러튼 1백만불대의 타운하우스 신축 vs 구축 어느 쪽을 선택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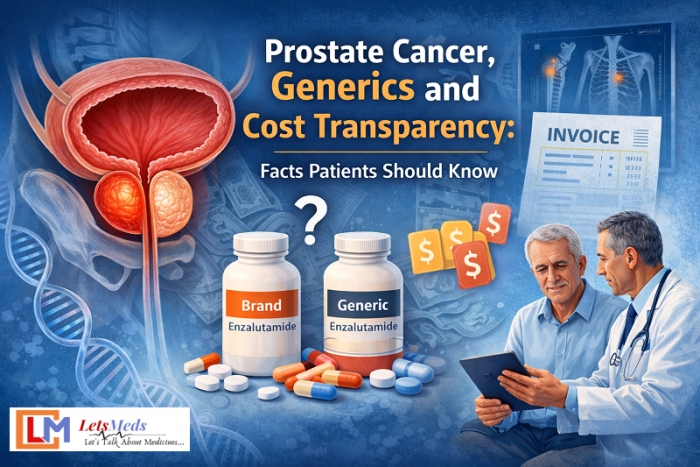 Prostate cancer, generics and cost transparency: facts patients should know
Prostate cancer, generics and cost transparency: facts patients should 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