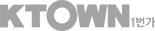- [내 마음의 그림] 지리산 노고단 VI4292021.06.14
- [내 마음의 韓詩 214] 忍冬香5132021.06.15
- [내 마음의 수필] Five Belgium Episodes7502021.06.21
- [Essay In My Heart] Openness and Diversity6142021.07.01
- [내 마음의 隨筆] 개방성(開放性)과 다양성(多樣性)8222021.06.29
[내 마음의 수필] Five Belgium Episodes
2021.06.21벨지움을 여행을 한지가 20년 너머 되었음에도 거기에서 겪은 기억에 남는 몇가지 에피소드가 있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 어느 할머니의 짓궃은 상술
브뤼셀 (Brussels)에서 벨지움 관광의 명소 겐트 (Ghent)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다가 나는 급히 화장실에 갈 처지가 되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유료화장실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의자를 하나 앞에 두고 입장료 (?)를 받으며 지키고 있었다. 나는 급한 나머지 노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여성전용화장실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였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었더니 왜 빨리 들어가지 않고 무엇하냐며 오히려 성화였다. 마침 남성전용화장실은 만원이었던 것이다. 얼떨결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여성전용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쉴사이 없이 들락거리는 여성고객들의 소리에 정말 언제 거기서 나가야 할지 매우 난처하였다. 한참을 기다리다 주위가 조용한 때를 기다려 쏜살같이 밖으로 나왔지만 웬지 마귀할멈 같이 요사스럽게 웃으며 나를 골려먹는 노파의 심술을 등 뒤로 하고서 다행히 겐트 행 기차를 올라 탔는데, 겐트에 도착할 때까지 나의 마음이 영 유쾌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 식당에서 물먹기
함께 한국에서 출장을 간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러 브뤼셀의 전형적인 동네 시장에 있는 유명한 노천식당에 갔다. 친구가 권유하기를 “물”을 시켜서 먹자는 거였다. 내가 무슨 물을 먹느냐고 했더니, 해외 여행 경험이 나보다는 한 수 위인 친구가 벨지움에서는 꼭 “물을 먹고 가야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면 후회할 거라고 하였다. 나중에 웨이터에게 음식을 주문할 때 친구가 자랑스럽게 “물” 하고 대답했더니 신기하게도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였다. 알고보니 “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홍합이었던 것이다. 아마 홍합의 영어 이름인 mussel이 프랑스어 (또는, 벨지움 고유의 Flamish 어 ?)로moules로 발음되는 것 같았다. 주문한 “물” (Moules et Frites) 요리가 드디어 나오는데, 찰리 채플린이 즐겨쓰던 멋진 신사용 모자를 뒤로 뒤집어 놓은 듯한 까만 플래스틱 용기에 “물”을 삶아서 조미료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알은 까먹고 국물은 마시는 거였다. 우리나라에서 포장마차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홍합국물의 맛과는 조금 다른데, 아마 마늘을 쓰지 않고 다른 향신료를 쓴 것 때문인 것 같았다. 많은 관광객들이 벨지움에 와서 “물”을 손으로 까 먹으면서 담소하는 모습은 아직도 내 뇌리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물”먹었다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인데 벨지움에서 “물”은 비싸지만 꽤 먹을만 하였다.
참고: Moules et Frites – Belgian’s national dish http://www.travelsignposts.com/Belgium/tag/moules-et-frites
- 오줌싸개 동상 (Manneken Pis)의 국제적 매력
오줌싸개 동상 (Manneken Pis)은 벨지움의 부뤼셀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다. 실상 동상을 찾기가 의외로 쉽지는 않았는데 꾸불꾸불한 골목길을 물어물어 찾아가니 아주 조그만 동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있어 그 것이 문제의 동상인지 알게 되었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해 거기서 알게된 바로는 일정한 기간을 미리 정하여 전세계에서 보내온 각 나라의 고유한 옷을 동상에 입혀 관광객들에게 전시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보내온 옷도 있다고 하는데 보지는 못 하였다. 사실 보고나니 별 것이 아닌데 입소문을 전세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퍼뜨린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상을 소재로한 수많은 관광상품을 제작하여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상품이 오줌싸개 동상 모형으로 만든 구리나 주석으로 만든 종(鐘) 이었다. 나도 선물용으로 몇 개를 샀는데 그 중 하나는 나의 사무실에 있는 책장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상이 예고없이 실례를 갑자기 그리고 세차게 한다는 것이다. 사진찍기에 전념하거나 동상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 없는 잡담을 옆사람하고 나누다가는 즐거운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 관광을 계획하는 분들은 조심하기 바란다.
참고: Manneken Pis
http://en.wikipedia.org/wiki/Manneken_Pis
http://www.journalog.net/raphy/38676
- 벨지언 프라이의 자부심
벨지움 사람들의 자존심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렌치 프라이 (French fries: 감자를 잘게 썰어 기름에 튀긴 요리)로서, 그들은 결코 그 요리를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지언 프라이”라고 하였다. 본래 그 기원이 벨지움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명칭에 관한지적재산권 문제를 조정하여 세계의 많은 패스트 푸드 업계에서 당연시하며 쓰고 있는 이름인 프렌치 프라이를 "벨지언 프라이"로 모두 고치고 로열티도 벨지움에 지불해야 한다는 거였다. 내 개인적으로 “벨지언 프라이”를 시식해 본 결과 그 맛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가장 큰 차이는 보다 넓은 감자채에 있었다. 미국의 프렌치프라이는 얇은 감자채 튀김이라면 벨지움의 “벨지언 프라이”는 굵은 감자채 튀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벨지언 프라이”는 먹을만 하였으며 벨지움 사람들의 자존심이 깃든 편리한 음식이라는 것을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참고: Belgian fries
French fries
http://en.wikipedia.org/wiki/French_fries
- 벨지움 사람들의 습관: 왜 구두일까?
벨지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상대방의 구두를 유심히 본다고 한다. 나라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하는 행동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 꽤 재미있는 습관이 아닐까 한다.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물어 볼 기회가 없었으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이유를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아무튼 벨지움은 조그만 나라지만 여러모로 아기자기한 면이 많아 유럽 일주 여행을 계획한다면 2-3일 정도는 충분히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솔티







 Generic Osimertinib 80 mg Low Cost in Philippines
Generic Osimertinib 80 mg Low Cost in Philippines
 미셀 오바바 관타나모 재판에서 사형 선고 소식 그리고 신체 검사 결과 분명히 남자 랍니다.
미셀 오바바 관타나모 재판에서 사형 선고 소식 그리고 신체 검사 결과 분명히 남자 랍니다.
 [내 마음의 隨筆] <미시시피 강 위의 살아 있는 말들: ‘허클베리 핀’의 남부 구어체 유머>
[내 마음의 隨筆] <미시시피 강 위의 살아 있는 말들: ‘허클베리 핀’의 남부 구어체 유머>
 “남과 나는 둘이 아니다 ” (Feb. 2, 2026)
“남과 나는 둘이 아니다 ” (Feb. 2,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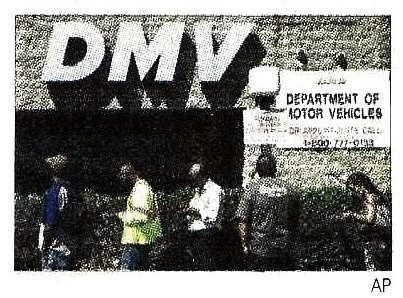 운전자들은 꼭 명심하자.
운전자들은 꼭 명심하자.
 나무가 뿌려질 정도로~?
나무가 뿌려질 정도로~?
 인지의 한계 (The Limits of Cognition)
인지의 한계 (The Limits of Cognition)
 437. 99회 LA 한인회 문화의 샘터 “퍼포먼스 라인댄스”
437. 99회 LA 한인회 문화의 샘터 “퍼포먼스 라인댄스”
 ICE 이민 단속 강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리는 진짜 이유
ICE 이민 단속 강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리는 진짜 이유